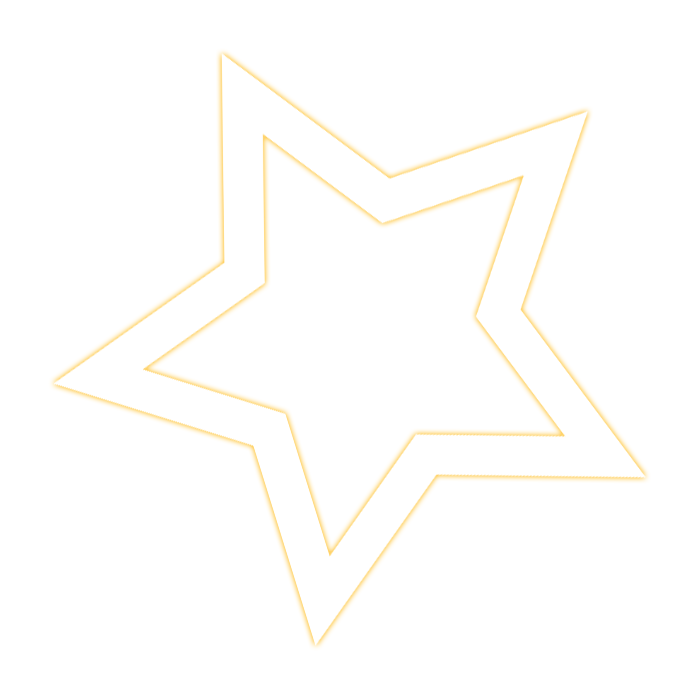타인의 시선
이 도시의 날씨는, 보이는 색만큼이나 제멋대로였다.
빛바랜 회색보다 더 얼룩져 바래진 색.
창문을 때리는 빗물에 흐릿하고, 검어진 한강을 보고 있자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떠오르고는 했다.
*
일을 그만두고 쉬기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간다.
가을을 뜻하는 달이 다가오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낸 듯 물을 쏟아붓던 태풍이 지나간 이 도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간다.
거의 10여년을 가까이 다닌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버틴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나는 기꺼이 포기를 선택했다. 오래 버틸수록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고. 붙들고 있을수록 주변사람들이 힘들어했으니까. 장기간의 수사는 여러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잡을 수는 있을까. 이번에는 잡을 수 있었는데. 진실은 항상 한 걸음 다가갈 수록 한 걸음 멀어져감에 끝자락에 희미한 빛만을 보며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 들게 만들었다.
진짜겠어? 그 사람 평소 행실을 아는데.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더..
그만! 하는 소리와 함께 결재서류의 뭉텅이가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이어지면 그제야 개미같이 흩어지는 이들을 불쾌한 눈으로 보는 것도 지겨웠고. 누군가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봐온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하지 않을 법한 일이나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들을 보면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겠지. 그 때문에 10여년을 가까이 쌓아둔 실적이나 지위를 내려놓고서 사직서를 내놓는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를 않았다.
태양이 내려옴에 점점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바깥을 보며 겉옷과 지갑, 차키를 챙겨 밖으로 나서니 어느 새 선선해진 날씨에 숨을 가볍게 뱉는다. 그만둘 때 힘들어서. 라고 했더니 이제야 힘들다는 말을 하느냐던 동료들이 떠올라 비식거리는 웃음을 작게 흘리게 만들었다.
반응들이 그럴 만도 한 게, 여태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힘든 투정이나 내색을 비친 적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를 퇴직하게 만든 사건은 이 전의 묵직한 비리나 중범죄에 비하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음에도 곧잘 피곤한 기색을 보이곤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일했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알 법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이와 관련된 사건이었으니, 내가 이렇게 정에 잘 휘둘리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했고. 차에 올라타 익숙하게 향한 곳에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먼저 술자리를 가지고 있어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들어가니 바로 알아본 듯 손을 흔드는 모습에 웃음 지으며 다가간다.
" 뭐야. 일 그만뒀다고 혈색이 어, 장난 아닌데? "
" 그러게요.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
" 다들 보고 싶어 하셔요. "
빈말은 적당히들 하지? 이어지는 웃음소리와 술잔을 부딪치는 소리.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따라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 울적한 기분을 피하고 마련해준 자리에 참석한 건데, 정작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꼴이라니 조금 우스운 기분이 들어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며 몸을 일으키니 곧장 따라 나오는 이에 모른 척 앞서 나간다. 상대적으로 지치는 상태인지라 따라오지 말란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할 거 같아 조용히 벽에 기댄다. 뭐, 할 말이라도 있니? 라는 말에 건네주는 돛대에 머뭇거리는 손길로 받아든다. 나 끊으려고 했는데. 대를 물자 자연스럽게 불을 붙여주는 모양새에 슬핏 웃으며 바라본다.
" 걱정돼서요. "
" 무슨 걱정? 퇴직하고 살만하구만. "
"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 사람 지켜보던 거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퇴직하신단 말 했을 때 아무도 붙잡지 못한 거 아시잖아요. "
" 허어. 너 나 퇴직했다고 이러기야? "
" 말 피하실 게 아니죠. 경감님. "
" 나 이제 경감님이라 부르지 마. "
" 그럼 뭐라고 할까요. "
" ...그냥 부르지 마. "
싸늘하게 떨어지는 말과 동시에 손끝에서 떨어져 내리는 재의 색이.
꼭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무뚝뚝하고 귀염성이라고는 전혀 없으면서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선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보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지켜봤고, 자신의 의지 하나로 경위까지 올라옴에 누구보다 응원했던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일이 터졌을 땐 저 하나의 직위로 막아줄 수도 없는 일이어서 답답하기만 했지. 21세기 이 나라의 헌법으로 연좌제1)가 없어진지가 언젠데.. 법이 그렇다하더라도 은연중에 도는 말로 사람 하나 망하게 만드는 데에는 도가 튼 집단 아닌지. 타인의 시선이란 이렇게 좆같은 일만 만들 뿐이었다. 대의 반 이상이 타들어가고 손을 지져 들어갈 즈음에 제 손을 쳐내는 걸 그저 망연히 보고만 있었고, 그 손을 감싸는 것 또한 망연히 바라봤다.
" 태성이, 오늘 생일이야. "
" 알아요. "
" 걜 위해서라도 더 이상 찾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
" ...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무죄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
" 나는 믿어도 되잖아. 그렇다하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싶어. "
" 아들처럼, 생각하셨잖아요. 말했다시피 다들 알고 있어요. 많이 아끼셨던 거. "
기어이 떨어지는 손을 받아주는 손이 까칠하다.
너에게 가진 건 사랑이라고도 연민이라고도 말할 수 없음에도, 이렇게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마음은 커질 수밖에. 돛대를 입에 대어주는 걸 가만 받고선 연이어 서네개를 바닥에 떨구고서야 자욱이 가리어지는 시야가 점점 걷어졌다. 이제 들어가자. 기다리겠다는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손을 잡아 이끄는 것에 반항조차 하지 않고 이끌려가니 다다른 편의점에 제가 피운 담배라도 사달란 건가 싶었는데. 말없이 문 앞에 두고서 홀로 들어가서는 얼마 되지 않아 손에 작은 조각케이크를 들고 나온다.
" 당장 줄 순 없겠죠. 앞으로도 못 줄 지도 몰라요. "
" 나는... "
" 그냥, 가볍게요. "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면, 동료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너에게는, 아니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무관심이 필요한 법인데.
인간들은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듯이 살아간다.
어쩌면 지금 내가, 우리가 너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언젠가 마주쳤을 때 어서 와,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면 되지 않을까. 너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었다고. 손에 들린 작은 케이크에 동료들의 수다스런 목소리가 멈추면, 나무젓가락 하나를 대강 꽂아선 불을 붙인다. 그 사이에도 목소리는 이어지지 않아, 젓가락이 다 타들어가 케이크에까지 불이 번져도 어느 누구도 그 불을 끄지 않는다. 타들어가는 냄새. 충치처럼 거멓게 그을린 케이크에 그제야 입을 뗀다.
" 생일, 축하하고 싶었어.. "
그에 이어지는 목소리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무슨 말이든 듣고서 축축한 울음을 참아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깨를 감싸는 손에 고개를 푹, 숙였다.
누군가는 너를 살인자라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네게 손가락질과 질타를 내뱉을 것이다. 그래도. 그래도. 어딘가에서 이 얼룩진 회색의 도시를 지켜보고 있길 바랄게. 생일, 축하해.
1)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